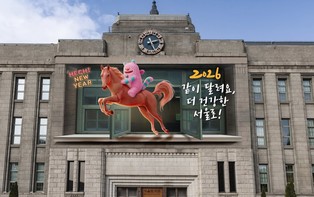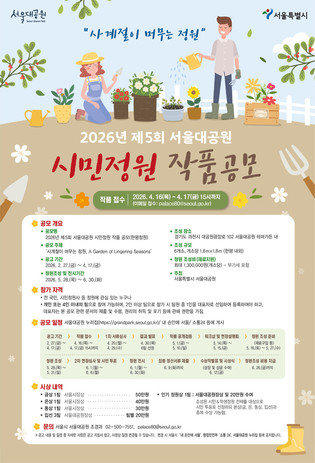|
| ▲ |
한국의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세계 순위도 14위에서 12위로 조정됐다. 팩트(Fact)는 기준년 개편 과정에서 산업 생산과 부가가치, 수요 관련 수치가 전반적으로 조정된 결과일 뿐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 │ 기초체력)’이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5년마다 이뤄지는 기준년 개편에 따라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년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꾸고 경제총조사 방식을 개선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이 6%나 늘어나는 등 관련 지표들이 일제히 개선된 데 따른 단순 수치상 호전일 뿐인 착시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 사실 국민소득이 일본을 앞선 건 엔화 가치가 원화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덕을 봤다. 따라서 일본, 대만 등 경쟁국들이 반도체 등 미래산업 투자에서 우리를 앞지르고 있어 수치상 호전에 안주해 있을 여유가 없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단지 국민계정 통계 기준 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꾸면서 전자상거래 등 누락이 되었던 사업체가 신규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모수인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가계와 정부 빚 비율은 눈에 띄게 떨어졌다. 실제로 이번에 기준 연도가 바뀌면서 1인당 GNI 3만 달러 달성 시기가 기존 2017년에서 2014년으로 3년 앞당겨졌다. 지난해 1인당 GNI도 3만 3,745달러에서 3만 6,194달러로 7.3% 올랐다. 하지만 단순 기준 변경으로 바뀐 통계 수치인 만큼 지표 개선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국내적으론 국민소득 증가에 취해 현실 경기 흐름을 잘못 판단하는 치둔(癡鈍)의 우(愚)를 범할까 우려된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 효과와 엔저, 통계 기준시점 변경 등의 효과가 한 번에 겹쳐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단번에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 6월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실질 GNI는 567조 5,0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2.4% 상승했다. 2016년 1분기(2.8%)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물가를 반영한 실질 가계소득은 3%대 소비자물가 상승률 탓에 1.6%나 줄었다. 코로나 위기가 한창인 2021년 이후 3년 만의 감소세로 서민들 삶은 여전히 고물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정책 당국은 GDP 수치가 커지면서 가계 빚과 국가채무의 비율 등이 눈에 띄게 떨어진 데 대해 자칫 건전성 정책이 해이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GDP 대비 가계 빚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4%에서 93.5%까지 낮아진 데 대해 강화된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완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50%를 넘었던 국가채무 비율도 50.4%에서 46.9%로 줄어든 것도 정쟁화 소지를 안고 있다. 기준년 개편에서 기준년이란 통계 작성 대상이 되는 상품 구성이나 개별 상품에 가중치를 제공하는 연도, 지수가 100인 연도 등을 의미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통계의 유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기준년을 바꾼다. 우리나라는 5년 주기로 국민소득통계의 기준년을 바꾸고 있다. 통계적 착시는 기저효과(Base effect)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기저효과는 기준시점의 통계가 어떤 특정 요인에 의해 한번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이면 비교 시점 통계의 변동성이 반사적으로 커지는 경우를 말한다.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년도가 바뀌면서 모든 경제 지표가 수치상 호전되고 있어 자칫 통계적 착시효과에 매몰되어 정책 결정에 있어 오판할 우려가 큰 만큼 현실 경기 흐름과의 괴리나 착시효과를 극복할 면밀하고 촘촘한 분석은 물론 냉철하고 명철한 판단과 지혜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