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가노지고로(嘉納治五郎)는 天神眞楊流의 급소지르기와 굳히기, 起倒流의 메치기 기법을 중심으로 竹內流의 捕縛術, 關口流의 낙법(落法) 등으로 고류유술의 많은 유파들의 기법을 비교·분석 연구해 강도관(講道館) 유도로 재정립했다. 강도관은 고류유술로 유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과 자유연습으로 상대를 제압(亂取)’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두었다.
자유연습으로 상대를 제압(亂取法, Randori)은 격투유술로서는 도복을 잡고 상대를 “맞잡는 것”을 시작하여 ‘메치기(投技)’와 ‘굳히기(固技)’로 하며 호신술로서 ‘급소지르기’와 ‘꺾기’도 중요시 했다. ‘급소지르기’는 상대와 간격을 유지하면서 대척하고, ‘꺾기’는 상대의 팔(前腕部), 손목 부위를 젖히기로 신체기법을 구사했다.
그때 당시 강도관의 유도와 일본 무덕회의 유도간의 다른 신체기법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기만 해도 강도관 유도의 자유연습으로 상대를 제압(亂取)하는 시점이었다. 일본의 무덕회(武德會)에서 승부심판규정을 결정하기 위해 일본 전국 최고의 유술선생을 회의를 가진다.
강도관 유도인은 야마시다요시아끼(山下義韶) 6단과 요꾸야마사꾸지로(橫山作治) 6단, 이소가이하지매(磯貝一) 4단 등 3명, 大東流의 하다야타로(半田彌太郞), 四天流의 호시노구몬(星野九門), 楊心流의 도쓰까히데미(戶塚英美良), 移心頭流의 우헤하라쇼고(上原庄吾), 起到流의 곤도모리타로(近藤守太郞), 竹內三統流의 사사끼민소(佐村正明), 關口流와 楊心流를 겸한 다께우찌스즈키류(鈴木孫八郞) 등 당대 최고 고류유술 고수들이 모여 회의를 실시했다.
그들과 회의를 실시했던 가노지고로(嘉納治五郎)는 고류유술로 유도를 재정립한다. 유도의 수련체계는 메치기, 굳히기, 급소지르기 등의 세 가지 신체기법을 구분했다. 유도의 수련 목적인 ‘승부와 신체단련, 수심(修心)을 강조함과 그리고 신체의 극한기법체계와 자유연습으로 상대를 제압(亂取)’하는 것을 정립하게 된다.
그때 당시 도복을 잡는 방법은 자호체로 잡고 했다. 하지만 유도에서는 자연체를 근본으로 했다. 도복 깃을 잡는 방법도 재정립했으며 걷는 보법방법, 몸 쓰기, 기울이기 등 근본 신체기법을 원리를 적용했다. 1889년부터 1899년까지 무덕회 유술경기 제정이전 까지는 경기나 연습에서 많이 사용된 조르기는 십자조르기, 역십자조르기, 안아조르기, 주먹조르기, 맨손조르기, 외십자조르기, 몸통조르기 꺾기로는 손목, 발목 등 꺾는 신체기법이 가장 많이 사용했다.
2018년 현재 금지되어 있는 신체기법인 목, 손목, 발목, 무릎 등의 꺾기와 몸통조르기 등을 구사했다. 고류유술에 있어서 중시되었던 급소지르기(Kinshi-Waza)는 메치기, 굳히기 등도 있었다.
특히 초기의 급소지르기는 “사지(四肢), 머리의 일부로 상대의 전신 중에 해를 받기 쉬운 부분을 찌르거나, 차거나, 때리거나 하여 상대를 아프게 하거나 기절시키거나, 아주 죽여 버리거나 안전히 신체극한까지 제압했다. 또한 자유연습(亂取, Randori)경기에 의한 연습 일단 가타(形)에서 습득한 기술체계를 쌍방이 자유로운 의지로 그 기술의 공방을 전개해서 서로 기술을 거는 기회뿐만 아니라, 변화의 순리와 응용을 체득하는 방법이었다. ‘굳히기 형’은 1960년 4월 10일에 제정된다. 처음에는 10형이었지만 이후에 15형이 전해진다. 특히 ‘굳히기 형’은 누르기기술, 조르기기술, 꺾기기술부터 대표적인 기술 각각 5본씩을 조합하여 ‘메치기 본’과 합하여 ‘란도리 노 카타(Randori No Ka)(乱取の形)’라고 한다.
강도관은 유도의 형을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올바른 누르기 방법이나 대응 방법, 조르기 방법, 꺾기 신체기법 방법 등 원리와 응용을 몸에 익힐 수 있게 된다. 즉 누르기 기법은 케사(Ke)가타메(Katame)(곁누르기), 카타(Kata)가타메(Katame)(어깨누르기), 카미시호(Kamisiho)가타메(Katame)(윗누르기), 요코시호(Yokosiho)가타메(Katame)(가로누르기), 쿠즈레(Kuzre)카미시호(Kamisiho)가타메(Katame) (위고쳐누르기) 등이다.
조르기기법은 카타쥬지지메(Katajujijime) (외십자조르기), 하다카(Hadaka)지메(Jime) (맨손조르기), 오쿠리에리(Okurieri) 지메(Jime) (안아조르기), 카타하(Kataha) 지메(Jime) (쭉지걸어 조르기), 갸쿠쥬지((Kakujuji) 지메(Jime)(역십자조르기) 꺾기기법은 우데(Ude) 가라미(Karami) (팔 얽어비틀기), 우데(Ude) 히시기(Hisiki) 쥬지(Juji) 가타메(Katame)(팔 가로 누워 꺾기), 우데(Ude) 히시기(Hisiki)우데(Ude)가타메(Katame) (어깨 대 팔꿈치 꺾기), 우데(Ude) 히시기(Hisiki) 히자(Hi) 가타메(Katame) (무릎 대 팔 꺾기), 아시(Asi) 가라미(Karami) (다리얽어비틀기) 등으로 신체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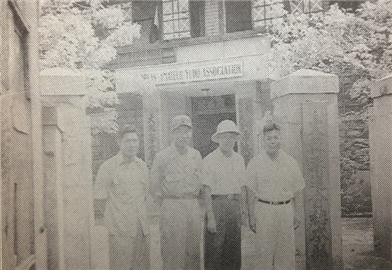 |
| ▲1953년 소공동 대한유도회·대한유도학교와 고 이제황 선생, 임원 관계자들의 모습이다. |
이처럼 현대화된 유도를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세계무도인들이 선호하는 고류유술의 신체기법인 ‘메치기’.‘굳히기’.‘급소지르기(當身技)’.‘꺾기(關節技)’ 등의 기법들을 재정립하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세계 무도계는 각종 종합격투기, 브라질 주짓수, 러시아 삼보 등이 극변하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 1906년 유도의 시발점으로서 1932년 1936년 1937년 이선길은 세 차례에 걸쳐 전일본선수권을 재패한다.
일본을 완전히 평정한 이선길은 대한유도회의 선구자인 한진희, 이제황, 석진경, 박정준 등을 이끌어주며 한때 용인대학교의 전신인 1953년 소공동 대한유도학교 교육체계에서는 하나하나 유도교육으로 실시했듯이 현시대의 유도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극한신체기법인 고류 유술적 측면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 서 있으며 현재 대한유도회 산하기관인 경기도유도회 학술위원회에서 보급형으로 저변확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송일훈 박사(동아시아 무예전쟁사·문화교류정책 평론가)
전)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연구교수
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전임연구원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