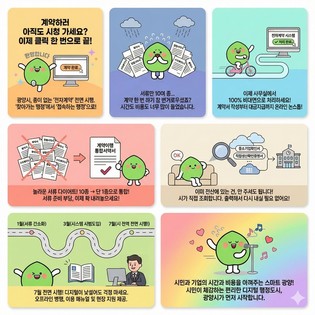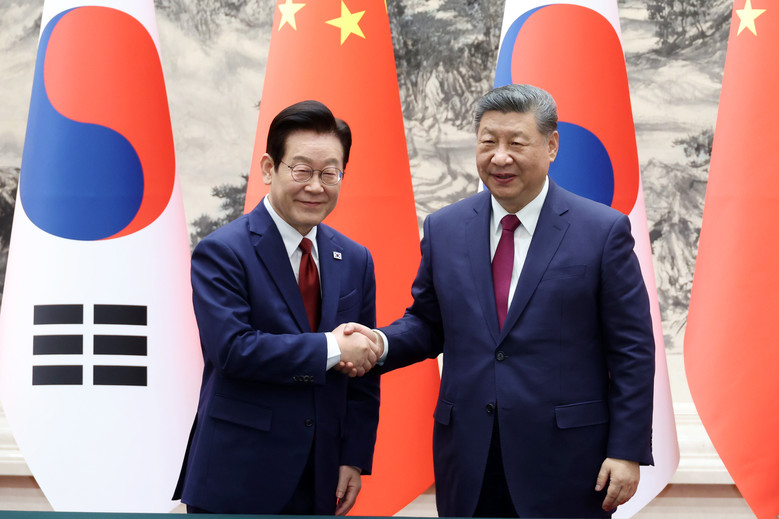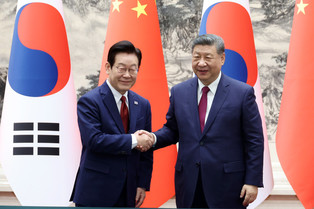|
| ▲ © 세계타임즈 |
지난 수많은 선거에서 복지에 대한 공약이 마구잡이로 쏟아졌다.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는 제처놓고 후보자들은 당선되면 그만이다는 식이었다. 정치에서 복지에 대한 본원적 성찰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복지란 무엇인가. 복지란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서 법률과 제도가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는 보통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로 나눈다.
사회보험은 개인이 보험료를 분담해 위험을 집단으로 대처하는 “리스크 분산”을 기본원리로 한다. 따라서 사회보험에는 민간보험과 공적보험이 있으며, 대체로 시장원리에 따라 최적화되고 있다. 민간보험은 개인이 스스로 가입과 보장을 선택하는 철저한 시장논리를 바탕으로 성립한다. 이에 비해 공적보험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가입과 보장을 강제한다. 공적보험에는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이 있다. 민간보험이나 공적보험에서 시장이 기능하거나 시장을 기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가입자가 부담하는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 효과를 최대화하는 효율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한편, 공적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득의 재분배를 기본으로 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좁은 의미에서 복지이다. 즉, 최저생계비나 노령연금을 말한다. 이렇게 소득 재분배를 정부의 책임 아래 국고를 투입하는 공적부조는 개인의 능력과 경쟁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 결과이다. 자본이 극대화됨에 따라 경쟁에서 뒤처진 저소득 계층의 몰락에 대한 사회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내지는 사회가 책임을 지고 부담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 제도는 현대국가에서 새롭게 등장한 인권인 생존권에 가장 친화적이다. 복지가 강조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복지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극히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인간의 최저생활 보장이 그 내용이 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정당화가 어려운 것이 복지의 기본원칙이다.
그런데 공적부조에는 소득의 재분배라는 기능이 있어서 시장의 원리에 맡기면 제도가 붕괴한다. 정작 구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시장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으므로 시장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 밖에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공적부조를 위해 시장원리를 강제로 수정해야 한다. 이때 공적부조는 공평하고 평등하게 취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다소 시장원리 지배 요소가 있는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을 시장원리를 배제하는 공적부조 원리에 적용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복지 정책이 절대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이다.
원래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기근이나 흉년이 닥쳤을 때 가난한 백성을 위해 쌀을 나눠주거나 빌려주는 복지정책이 있었다. 조선 시대에 구휼미나 환곡이 그것이다. 복지가 현대국가에서 갑자기 새롭게 대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가 깊은 제도이다. 그 원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이다.
궁극적으로 성숙한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구체적 생존권 보장을 얼마나 실효 있게 이행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국민건강보험을 손 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같은 공적부조 제도를 먼저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고 나서 필요하다면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등 공적보험을 시장원리에만 맡기지 말고 소득의 재분배, 경제적 생존권 보장의 측면에서 국민 모두의 합의로 재고해야 할 것이다.
복지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보수와 진보의 논리에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성숙사회를 이룩하는 첫걸음이 된다.
조규상 박사(통일한국재정정책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