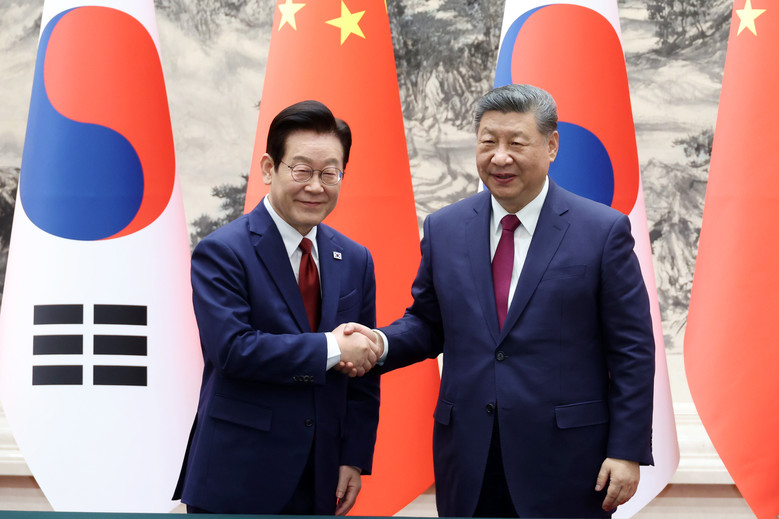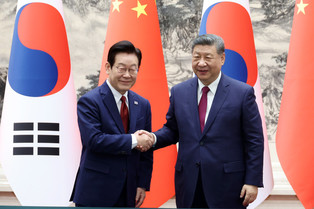|
| ▲ 송일훈 박사(동아시아 무예전쟁사·문화교류정책 평론가) |
고류유술의 유파인 기도류(起倒流)는 후쿠노 마사카츠(福野正勝)가 창안한 후쿠노류(福野流) 유술부터 시작된다. 기도류(起倒流) 시조인 후쿠노(福野)는 섭진랑화(摂津浪華)에서 출생했다. 이 지역은 현재로 말하면 대판(大阪)이다.
그는 사전평좌위문정(寺田平左衛門定安)로부터 복야류(福野流)로 전래되었던 것이 사전감우위문정중(寺田勘右衛門正重), 경극단후수고국(京極丹後守高国)의 신하 복야정승(福野正勝)의 3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기도류(起倒流)이라고 개명하게 된다. 횡산건당씨(横山健堂氏) 기록에 의하면 기도류(起倒流)는 같은 복야(福野)의 문(門)이며 그는 회목전재(栃木専斎)의 명명으로 사전(寺田)은 자류(自流)가 속하는 유파를 진신류유도(真信流柔道)이라고 했다. 이것을 유술(柔術) 또는 유도(柔道)이라고 개명한 최초의 인물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복야(福野)로부터 3대에 이르러 사전감우위문정중(寺田勘右衛門正重)에 의해 기도류(起倒流)를 창시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으나 일본 고류유술에 에도마포(江戸麻布)의 국정사(国正寺)에서 진원빈(陳元斌)의 권법이 전해주었다는 것에 많은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기도류(起倒流)는 진원빈이 하는 권법과는 성질이 다른 무예이며 다른 형태의 신체기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감우위문(勘右衛門)은 처음 경극고국(京極高国)의 무사로 있었지만 후에 송강후(松江侯)의 무사가 되며 1674년 8월 17일 57세에 사망한다. 그의 제자 중에 길촌병조부수(吉村兵助扶寿)가 걸출한 인물이 있었다. 그 이후에 작주진산(作州津山) 삼가(森家)의 무사가 되어 쌀 200석(石)이 주어졌다.
1637년 자목우좌위문후방(茨木又左衛門後房)의해 《起倒流亂目錄》 전서가 편찬된다. 그는 이 전서를 편찬하여 낼 때, ‘난(亂)’을 선승인 다쿠앙(澤庵)에게 가지고 가자 다쿠앙은 ‘기도류란(起倒流亂)’의 ‘본체(本體)’와 ‘성경(性鏡)’의 2권의 전서를 나누어 그에게 주었다. 이로부터 기도류(起倒流)는 당초에 선(禪)의 심법(心法)을 받아들여 전서를 집대성하게 된다. 이런 기술의 구성은 체(體), 체차(體車), 정(請), 좌우(左右), 전후(前後)의 5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유끼쯔레(行連), 유끼찌가이(行遠), 유끼아떼(行當), 미꾸다끼(身碑), 타니스베리(谷滑) 5가지(이학래(1990), 한국유도발달사, 보경문화사)를 포함해 다시 히끼오찌(引落), 세이호나와(生捕繩) 등 15가지의 병법이 있다.
특히 에도중기에 기도류(起倒流)의 모든 신체기법 체계가 정리가 된다. 이는 3대인 요시무라(吉村)는 겉으로는 가타(形)를 가라다(體), 유메노우찌(夢中), 료꾸히(力避) 등 14본, 안으로는 가타를 미끄다끼(身碎), 구루마가에시(車返), 미즈이리(水入) 등 7본으로 합계 21본의 신체기법을 창안하게 된다. 야마모토 요시야스(山本義泰(1987). 『柔術の技法と思想』, 天理時報社)는 강도관(講道館) 고식형(古式形)은 기도류(起倒流)의 ‘요로이 구미우찌’형을 보존한다.
그 밖의 다른 유파가 급소지르기(當身)와 역기(逆技)라고 말한 여러 기술들 중에서 기도류(起倒流)의 가타는 요로이 구미우찌를 주체로 한 허리기술, 메치기 등이 있다. 즉 기도류(起倒流)의 주요한 전서(傳書)인 천의 권(天の券), 지의 권(地の券), 인의 권(人の券) 세권의 저서에서 요시무라(吉村)에 의해 창안된다. 천의 권(天の券)에서는 ‘기도(起倒)’의 문구에 대한 설명과 “적(敵)을 보고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허령(虛靈)에 대한 안정된 처사, 본체(本體)에 갖춰 져야한다”는 등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류(起倒流)의 본지인 본체의 방법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그러므로 지의 권(地の券)에서는 ‘무박자지사(無拍子之事)’와 ‘전후제단지사(前後際斷之事)’등 9개조를 강조했고 상대와 대적할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어 최초의 무도지침서이다. 여기에는 인의권(人の券) 21본(本)의 가타(形)가 있다. 즉 기도류(起倒流) 신체기법과 심법에서도 그림으로도 충실하게 표현되어 있다(二木謙一.入江 康平.加藤 寬, 1994).
여기서 가노지고로(嘉納治五郎)는 훗날 인의 권(人の券)에 있는 21본(本)의 가타(形)를 강도관 유도의 ‘옛 방식 고식의 형(古式の形)’으로 제정형을 만들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친 형식의 틀로 가두어 옛 고류유술의 실전적 격투 흐름이 사라졌다는 것과 직계제자인 당대 최고의 유술가 사이고 시로(西郷四郎)와의 갈등적 원인도 여기서 발생했다는 것을 미리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마사시게(正重)는 유소년 시절부터 무예에 재능이 있었다. 그는 당시의 유술 구미우찌(組計)를 수련하여 기도류(起倒流)를 탄생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이는 기도류(起倒流)의 유의(流義)는 도리가타(取形)를 근본으로 하여 기(氣)수행을 통해 모든 신체기법을 완성하게 되며 제일 중요한 사안이 존재한다. 즉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기술이지만 욕심을 버려야 극기(克己)의 정신으로 상대를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마사시게(正重)는 자신을 이기고, 스스로의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길을 얻는 연구를 하여 5권의 전서를 완성한다. 즉 14개의 가타(形)를 창안하여 마음을 다스려 신체의 올바른 신체기법을 지도한다. 이는 정(靜)한 곳으로부터 속(速)이 나오고 부드러움(柔)에서 강함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낸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드러움(柔)의 개념보다 확실하다. 고로 부드러움(柔)은 강에 뿌리를 두고 반면 강한 것은 부드러움(柔)에서 강함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음중양(陰中陽), 양중음(陽中陰)이라고 한다.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첫째, 기(技)보다 기(氣)가 먼저 나와야 하며 심기(心機)와 구기(樞機)라고 한다. 기도류(起到流)는 항상 14개의 형(形)을 근거로 하여 수행을 하여야 하며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이치를 터득함과 동시에 성(性), 심(心), 기(氣) 등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이것은 인식하면 복잡한 이치라 할지라도 종국에는 하나의 유의(流義)가 된다.
둘째, 물과 물결의 이치와 같이 움직이는 방법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습하는 방법도 깨닫게 된다. 특히 모든 사물의 근원 움직이는 것을 물결에 비유한다면 잔잔히 머물러 있는 상태(靜)를 물이다. 즉 물을 정신에 비유하면 기(氣)는 물결에 비유할 수 있는 형이상학적 존재이다. 이 물결이 진정되면 곧 머물러 있는 상태인 물로 돌아간다. 물과 물결은 두 개이지만 이는 곧 하나라는 의미가 된다.
셋째, 문(文)과 무(武)는 좌우의 손과 같고 차의 양륜(兩輪)과도 같다. 문무(文武)는 천지의 이치이고 문은 천(天)과 불(火)을 의미하며 무(武)는 땅과 물(水)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일흡일호(一吸一呼)가 있으며 이치에 의해 기도류(起倒流)가 성립되는 초석이 된다.
넷째, 기(起)는 양을 의미하고 도(倒)는 음을 의미한다. 즉 문(文)을 중심으로 하고 무(武)를 소홀히 다룬다면 결국 결단을 잃어버리고 만다. 반대로 무를 중심으로 하고 문을 소홀히 하면 진퇴에서 헤매게 된다. 문무를 겸비하는 것이야말로 사리(事理)의 묘합(妙合)이며 현시대의 무도교육의 반드시 필요한 존재적 가치이다.
그러나 이(理)는 순간적으로 깨달을 수 있지만 기(氣)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 단계씩 수행에 의해 습득된다. 천지간에는 이(理)가 있다. 이(理)를 느끼며 몸을 움직이게 되면 기(氣)라는 것으로 변하게 된다. 여기서 변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소나무에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는 것 같다. 또한 물과 물결과 같이 물이 움직이게 되면 물결이 생기는 것과 같다. 기(氣)는 한번 움직이다가 다시 조용해지며 그 조용해진 상태를 음(陰)이라고 말한다.
다섯째, 조용한 상태에서 다시 움직이는 것을 양(陽)이라고 한다. 음양이 다섯 가지로 분리되어 목, 화, 토, 금, 수(木, 火, 土, 金, 水) 음양오행으로 되고 다시 이 다섯이 화합하여 사람과 금수초목(禽獸草木)을 이루게 된다. 이것을 사람의 몸에 있는 성(性)이라고 말한다. 즉 성(性)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형태도 보이지 않지만, 사람은 성(性)움직이면 소리를 내고 사물에 대해 말하게 된다. 성(性)이라는 것을 예로 들면 거울과도 같다. 거울에 매화나무의 꽃을 비추면 매화꽃이 비치고 대나무를 비추면 대나무로 바뀌어 비쳐진다.
성(性)에 어떤 사물을 향하게 되면 향하는 사물이 비추어지기 마련이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과도 같다. 보이는 사물에 의해 성(性)이 움직이는 것을 마음이라도 한다. 또한 사람의 몸에는 기(氣)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마음의 바깥에 있다. 기의 근본은 원기이다. 배꼽 밑에 위치하며 지긋하게 눌러 보면 항상 느낄 수 있다. 기(氣)가 마음을 움직이면 단전을 중심으로 좌우로 이동하게 된다. 그 기(氣)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강하면 마음이 그 기(氣)에 의해 움직여지게 되어 사물을 해치게 된다. 마음(心)이 기(氣)에 의해 움직여지면 그르치기 쉽고 기가 마음에 따라 움직이면 사물의 흐름에 그릇 침이 없게 된다.
특히 기도류(起倒流)의 류명(流名)에 관한 내용은 《起倒柔術総論》과 《起倒流伝書注釈天》권을 보면 같은 이치와 의미이다. 기도(起倒)의 두 글자 의미 조화를 이루어지는 범어다. 해(奚)는 서거나 앉은 동작이다. 이는 천지의 문이 열려서 만물이 소생한다. 그 중에 제일의 영장은 인간이다. 그 이유는 올바르게 천지의 이치와 도리를 채우는 것이며 이것을 소천지라고 말한다.
이처럼 입, 거, 지, 방(立, 居, 持, 放)의 4개 기법을 인간이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즉 하늘의 이치를 받은 자연의 음양행동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나누어 말하면 입거(立居)는 대강이라 하고 지방(持放)은 소이다. 모든 행동은 입거(立居)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기도(起倒)이라고 말할 때는 모든 행동을 통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류의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내 몸을 천리의 수용대로 하여 적어도 인간이 갖춘 것은 부득이 하다. 즉 만사 천리에 의거해서 양쪽 모두에 서는 것을 얻는다. 이것은 당류의 취지이다. 이 신체기법은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내 몸의 이치를 먼저 궁구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기도류(起倒流)유술의 근본 원류이다. 다음 편에서 계속 연재한다.
송일훈 박사(동아시아 무예전쟁사·문화교류정책 평론가)
전)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연구교수
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전임연구원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