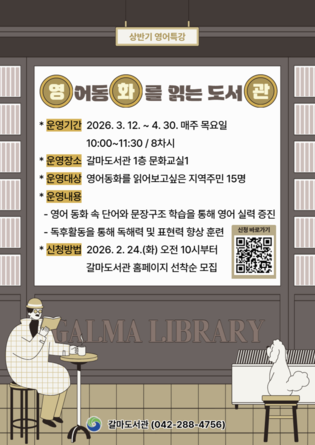|
| ▲송일훈 박사(동아시아 무예전쟁사·문화교류정책 평론가) |
일본은 조선의 임진왜란 패배 이후 전장실전 격투술이 눈부시게 발전한다. 거기에 세이고우류(制剛流) 유술이 존재한다. 성립배경은 임진왜란 이후 1532년 6월 도꾸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1543~1616) 초기(1634~1643) 세이고우류(制剛流)가 창시된다. 또 도꾸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와의 3대에 세끼구찌(制剛流) 신음류(新心流) 역시 창시된다.
이러한 세이고우류(制剛流)는 야와라(俰), 이아이(居合), 나와(繩)를 주로 한 초기유술이었다. 미즈하야노부나가마사(水早長信正)가 창시하여 전승했다고 하고 있으나 그는 어떤 사람이고 어느 지방 출신인지 확실하지는 않다. 일설에 의하며 교토(京都)의 사람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1536~1598)에게 임명돼 최후까지 지킨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후 부랑자로서 섭진(摂津)에서 삶을 살았다. 이 지역을 현재로 말하면 대판(大阪) 북서부에서 병고(兵庫) 현 남동부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은 임진왜란 패배 이후 다시 재무장했던 사실을 세이고우류(制剛流) 유술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조선은 문의 나라로 발전하지만 일본은 무의 나라로 발전하면서 상무적 기풍을 만들었다. 아무튼 우리는 임진왜란 이후 일제강점기의 과거 침략당한 뼈아픔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인식적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만큼 무의 실용적인 사유적 사고가 있어야 상무정신과 나라가 부패하지 않는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나라가 된다.
그렇다면 세이고우류(制剛流)에 관한 고증문헌은 《武芸小伝》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세이고소우(制剛僧)는 굳세고 용감하고 모든 신체기법이 다른 무사들보다 월등했다. 즉 세이고소우(制剛僧)로부터 방법을 배워 이것을 세이고우류(制剛流)라고 일컬었다. 이이지마(飯島)의 《日本武芸名家伝》에 의하면 미즈하야노부사에몬나가마사(水早長左衛門信正)는 국정사(国正寺)에서 진원빈(1595∼1671)로부터 유술이 아닌 권법을 사사 받고 있던 세 명중 한 사람이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고류유술의 역사가 진원빈의 권법기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즉 기패차랑좌위문(磯貝次郎左衛門)과 동일한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 그러나 복야(福野), 삼포(三浦) 등이 각각 유파를 세우고 창시한 것에 대해 기패류(磯貝流)에서 자취가 없기 때문에 많은 의문이 남고 또 세이고우류(制剛流)는 진원빈의 권법과 신체기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장년간(慶長年間)의 1596~1614년에 야규 무네요시(柳生宗厳)이나 카미이즈미 이세노카미 히데츠나(宝蔵院胤栄)와 함께 금춘칠랑(今春七郎)에게 자격증을 주었단 것을 보면, 국정사(国正寺)의 세 사람 보다 시대가 더 오래된다. 그의 동문으로 미원원좌위문직경(梶原源左衛門直景)이 나와 미주의직(尾州義直)에게 시중을 들었다. 이로 인하여 쌀 150석(石)을 받았으며 종가의 사범이 되었고 그는 1685년 4월 22일에 사망했다.
특히 일본 유술가 진원빈의 권법과 아무런 상관없다는 기록과 여기에 정확한 고증문헌이 존재한다. 《本朝武藝小傳》에 의하면 “옛날에 세이고우 스님이 미즈하야의 관(館)에 찾아와 말하기를, 당시에 무용(武勇)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여 야와라(俰)를 세이고우스님에게 배웠기 때문에 유파의 이름을 세이고우류(制剛流)라 했다.
특히 세이고우류(制剛流) 기술의 근원은 “부드러움에 이르러 강함에 도달하여 제압하여 의(義)가 되는 것이다”라고 한다. 이 가문 역시 통일 신라계 도래인 후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賴朝) 후예라는 기록들이 존재한다. 즉 세이고우류(制剛流)는 부드러움에 도달한 몸을 맡기어 강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 유파의 기술내용은 1643년경 《俰五身傳》에 사소이(誘引), 우쯔루(移), 요우운(橫蕓) 등의 20여 개조가 열거되어 있으며 후에 다수의 기술이 추가된다.
현재 《制剛流俰任方口傳書》에서는 손을 잡는 기술 9개, 뒤에서 잡는 기술 5개, 서서하는 기술 8개, 고구소꾸(小具足) 29개, 가타메 16개, 나와(繩) 8개, 야와라데(俰手) 15수, 야와라쿠미아이(俰組合) 9개, 야와라바네데(俰羽手) 17개 전체 117개조 신체기법으로 이루어졌다. 야와라(俰)를 기본으로 도리데(捕手), 고구소꾸(小具足), 나와(繩) 등을 포함한 종합 전장격투무예이다. 이러한 흐름 이외 자연의 이치 중에 물의 성질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그 신체기법을 음양의 법칙에 따라 구성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제강류(制剛流)는 손을 잡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무조건 부드러움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柔)는 원래 적(敵)의 강(剛)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약(弱)은 원래 적(敵)의 강(強)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신체기법을 절차탁마하는 마음으로 유(柔)와 강(剛)의 이치와 극치를 깨우쳐야 한다. 무사는 절차탁마하는 마음으로 전력을 다하여 모든 신체기법을 진심으로 습득하고 수행에 임해야 한다.
즉 스승은 꽃술을 주워 순수함을 모아 가르치는 사람은 본인의 내제가 실전격투에서 승리를 쟁취하기가 쉽다. 이는 그 곡절은 유(柔)이고 강(剛)이며, 강(剛)이고 유(柔)이며 체용(体用)을 겸비한다. 그 정밀이 이르러 맞는 도리는 종이 위에서 글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생각건대 이것을 가르치는데 유(柔)부터 시작한다. 노자(老子)의 《道德經》 말하되, “유(柔)에 이르는 것은 강(剛)에 이르는 것을 제정하는 도리이다”라고 한다. 유(柔)와 강(剛)의 이치와 극치가 합일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부드러움이 아니라 강한 심이 있는 자연적인 물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부드러움을 말한다.
이것을 일컬어 제강일류(制剛一流)라고 한다. 그 뜻이 좋고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힘쓰면 입신의 길(道)에 있어서 반드시 대보(大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제강류화전(制剛流俰伝)는 화(俰) 표(表)는 포수(捕手) 표라고 해도 다르지 않다. 화(俰)는 깊게 들어간다. 포(捕)는 생포 토(討)는 구미우찌(組討)이다. 또 족경포수(足軽捕手)를 가르치는 것은 소기자(素肌者 : 투구와 갑옷을 착용하지 않는 사람)의 포수(捕手)이다. 다음 편에서 계속 연재한다.
송일훈 박사(동아시아 무예전쟁사·문화교류정책 평론가)
전)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연구교수
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전임연구원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