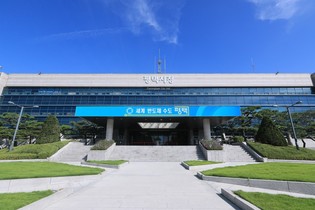|
| ▲ |
영국은 브렉시트(Brexit)에 관한 EU와 합의문을 둘러싼 국내 정치가 혼돈하고 있다. EU의 관세동맹에 당분간 영국이 머무를 것인지 아닌지 이견이 분분하다. 이것도 결국 영국의 자국 이익 때문에 불거진 사태다.
이제 국제상호주의보다 자국이익주의가 우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권 또는 국민주권 문제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그것은 바로 국가주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다. 그 뿐만 아니라 국가주권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한 이론이냐는 의문도 든다.
원래 근대적 주권론은 16세기 프랑스 정치사상가로 유명한 보댕(Jean Bodin, 1530-1596)이 완성했다. 칼뱅파 교도인 보댕은 당시에 여성의 자유가 신장하고 가부장적 전통적 제도의 균열이 생기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주권이론을 전개했다.
그러나 절대군주국가의 무조건적 맹목적 군주주권을 보댕은 주장한 것이 아니다. 보댕의 주권론은 법과 관습에 따라 “주권에 의한 바른 통치”를 강조했다.
즉, 보댕의 주장은 이렇다. 가족공동체에는 가부장의 처자에 대한 강력한 인적 지배권이 필요하다. 동시에 가족의 구성원인 아내와 자식은 노예와 다르게 속박되지 않지만 일정한 규율을 지켜야 하는 존재다. 이것이 국가에도 똑같이 투영된다.
가장(성인 남성)인 모든 시민은 주권(국가 및 국왕)에 의해 자유가 제한되고 주권에 복종하는 신민(臣民)이다. 이들은 노예와 구분된다. 비록 신민에 속하지만 비자유인 노예와 다른 자유로운 신민인 것이다. 자유 신민(시민)은 군주와 함께 승리자이다. 패배자인 노예와 구분된다.
그러므로 군주가 신민의 인격과 재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민에게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는 통치를 보댕은 꿈꿨다.
결과적으로 보댕의 주권론은 신권의 절대성을 맹신하는 중세국가의 변용을 통해서 근대적 주권국가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말하자면 보댕은 주권 아래서 통치되는 공동체로서 현대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국가 이론을 기초했다. 보댕의 주권은 고유의 절대적이며 불변한 것으로 국가주권과 군주주권의 범주에 들어간다.
여기서 보댕의 군주주권은 루소의 인민주권에 의해 부정되지만, 국가주권은 현대도 그 근간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EU에 의한 유럽통합이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주권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 한 예로서 국민주권적 측면에서 국가주권을 제한하고 “통일체로서 주권” 이론이 제기되어 연방 또는 연합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남북 정상이 만나고 DMZ의 GP를 일부 철거하는 남북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에 대한 국가주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앞으로 신성시되고 절대적이고 불변인 국가주권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
국가주권의 변용이 철저히 이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통일을 향해 일보 전진을 하더라도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후퇴할지 모른다. 남들은 서로 뭉치는데 남북은 아직도 전 근대적인 국가주권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심한 이념논쟁을 하고 있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보호무역과 무역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위기가 한반도에도 다가오고 있다. 무역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으로서는 남북의 단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상대방의 주권을 인정하며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안할 수 있는 연방론적 주권이론 구축이 시급하다. 그런데 국민대표인 국회는 전혀 해결할 자세를 보이지 않아서 주권자 국민으로서 걱정이다.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