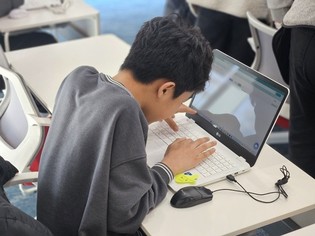|
| ▲ |
여기서 말하는 덕이란, 매킨타이어가 말하는 인간존재의 미덕과 숙련된 기술에 한정된 의미와는 달리, 인, 의, 예, 지(仁, 義, 禮, 智)이라는 우주의 이치를 담고 있는 유교적 덕이라는 더 깊고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투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릴 수 있다(이진수(1992), 「인문 사회과학편 : 퇴계철학에서의 체육사상연구」, 한국체육학회). 투호란 일정한 거리에 떨어진 둔병에 살을 던져 넣는 놀이이다. 이는 죽시의 두살반 180cm정도 거리에 투호를 두고 죽시를 던져 넣는 놀이기구이나, 퇴계 이황은 투호를 정신을 집중하는데 사용하였기에 이는 일명 정심투호(正心投壺라)라고도 한다. 그는 그 자신은 물론 제자들에게도 이를 열심히 하도록 권했다. 투호를 통해서 그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원래 투호는 온 몸의 균형을 잡고 거리를 정확히 측정해야 그 적중률이 높다. 몸이 흐트러지면 결코 잘 맞힐 수가 없다. 또한 정신력을 집중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지 정신력의 집중이 중요하겠지만 투호는 잡념이 생겨 정신이 산란해지면 결코 명중시킬 수가 없게 된다. 그리하여 첫째는 건강을 위하여, 둘째는 정신집중을 위하여 그는 투호를 생활 속에 도입했던 것이다. 퇴계 이황은 글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에게 먼저 투호를 시켜 보았다. 이를 통하여 그 사람의 솜씨를 보고 건강을 첨 쳐보고 또한 학문을 할 수 있는 집중력을 가늠해 보았다.
퇴계 이황은 정좌함으로써 계신공구의 공부를 쌓았으며, 투호로써 주일무적(主一無敵)하여 진정한 경(敬)의 경지로 나아갔다. 방심을 붙잡아 몸과 마음을 경으로 다 잡으니 이때의 경은 심평체정(心平體正)의 경지일 터이다. 퇴계 이황은 그의 일기에서 투호에서의 체험을 투호신중(投壺神中)이라 적고 있다. 투호의 신중을 위해서는 심평체정만이 필요할 뿐 그 어떤 꾸밈도 필요가 없다. 몸과 마음을 투호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할 뿐, 정신을 통일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재중간(一在中間)이다. 일이 투호라는 신체운동의 과정 사이에 존재한다는 말이다. 이 일은 다시 말하면 주일(主一)이니, 이는 경 그 자체인 것이다. 즉 마음을 두 갈래로 놓지 않고 한곳으로 집중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투호에 전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화살을 병 속에 던질 때 손의 동작에 전일해야할까! 무례하지도 말며, 장난도 하지 말며, 등을 돌리고 서지 말라는 투호의 예절에 전일하여야 할까! 이를 위해서는 신체는 물론 정신이 일체가 총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투호는 겉으로는 일정한 거리에 놓여 진 병 속에 화살을 던져 넣어 승부를 가리는 간단한 운동이지만, 실제로는 심오한 신체사상의 운동인 것이다.
무슨 이유로 투호를 선택하였는가라는 의문으로부터, 투호를 하는 사람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그 개인의 유의한 존재형식을 탐구하는 것이 된다. 투호의 의미를 기술하거나 혹은 사람들이 투호에 참가하는 이유를 확인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각각 서로 다른 독특한 상황에 자기 자신을 몰입시키며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동기나 지향을 탄생시키기 때문이다.
투호신중이라 한 퇴계 이황의 체험은 그의 존재로부터 나온 본질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그의 경철학의 존재형식과 일치되는 체험이기도 하다. 투호는 겉으로는 화살을 병 속에 던지는 단순한 운동이지만 심평체정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심평체정이 바로 경 철학의 출발이라는 유의한 체험은 퇴계 이황으로 하여금 그의 제자들에게 까지도 투호를 실시하게 되는 원인된 것이다. 자기 자신의 경에 투철함으로써 얻어진 투호신중의 극적인 체험이 퇴계 이황의 경철학 체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퇴계 이황의 실천적 철학은 그의 가언(嘉言)과 선행(善行)과 함께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언행일치(言行一致) 내지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을 통해 그의 언행관(言行觀)에 대한 전번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퇴계 이황에게 있어서 지행합일이란, 일상생활속의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을 고인(古人), 즉 <성인(聖人)>의 삶에 비추어 행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이정화(2005), 「퇴계 이황의 언행론에 대한 고찰 -『동학(東學)』 관련 서책을 중심으로- 」, 한민족어문학회).
한국 교육의 철학 부재문제에서 출발하여, 퇴계 이황의 교육사상을 확립하기 위한 유가의 덕성 함양론에 있어서 기본적인 교육의 원리는 위기지학(爲己之學)이다. 유가의 그것은 개인이 도덕적인 인격 완성이고, 기질변화(氣質變化)라 할 수 있다. 이는 학문의 목적이 출세와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 내지는 주체성을 찾아 자신을 도덕적인 인격체로 완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퇴계 이황은 이러한 철학의 바탕 위에 경사상 입지(立志)의 지행병진(知行竝進)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퇴계 이황의 언행론에는 학문의 원리에 바탕으로 공부하는 내용을 담아 올바른 스승상을 주었던 것이다(서은숙(2001), 「이황의 『 언행록 』 에 나타난 도덕적 주체성 교육론」, 한국국민윤리학회).
그렇다면 이진수(2001)의 《동양무도연구》중에 무도에 관한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무도의 모든 기본이 신체의 기술로부터 시작되고 출발한다는 신체사상은 장자의 사상과 같다. 도만을 입으로 부르짖는 신체가 없는 관념은 신체가 없는 정신만의 것이 되고 만다. 신체의 기술을 극한에 까지 끌어 올리지 못하면 도의 경지에 다다를 수가 없다. 최상 위 도의 경지는 신체의 기술이 마음과 일치되어 무위의 경지에 이르러서야 완성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종 무도에 보이는 신체사상이 있다.
무도는 수련에 있어 수련자들에게 신체의 마음가짐을 강조한다. 무도란 무술을 배우는 수련생들이 수행을 통해 그들의 도덕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체수련에 앞서서 올바른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다. 항상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신체 수련을 게을리 하지 않는 사람만이 무도수행에 있어서 도를 체득 할 수 있는 것이다.
「무」를 수련하여 신체와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직통(直通)의 경지에 도달 할 수 있으며, 「무」의 「도」는 저절로 완성된다(송일훈, 이황규(2005), 「일본무도에 신체지에 관해 -- 술에서 도로 승화된 일본무도의 창시자들의 신체지론을 중심으로 - 」, 한국체육학회지).
무도에서는 상대와 대결을 할 때, 내 마음을 비추면 기술을 걸지 못한다. 내 자신이 상대에게 어떠한 기술을 한다는 것을 내 머리 속으로 계산할 때, 이미 상대는 이를 간파하여 기술을 방어한다는 것이다. 내가 어떠한 기술을 상대에게 하는 것을 내 스스로 모를 때, 비로소 상대에게 기술을 걸 수 있다. 이는 마음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무도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무박자(無拍子) 진수’라고 한다.
원래 인간은 천지의 기를 받고 태어나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는 자연과 인간이 화합하는 동시에 천지와 인간은 하나의 우주법칙에 의해 합일한다. 기는 살아 있는 생명력이고, 심기체는 몸의 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몸의 올바른 자세는 곧 유술을 수련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요컨대 유술을 열심히 ‘절차탁마(切磋琢磨)’ 하는 마음으로 수련하여 정상에 이를 때, 비로소 무박자 진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 무박자의 진수를 체득하면 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이때에 어떠한 상대와 대적하더라도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본무도의 담긴 유교사상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당대 퇴계 이황의 학문이 일본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퇴계 이황의 학문이 일본무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료인 것이다. 다음 편에서 계속 된다.
송일훈 박사(동아시아 무예전쟁사·문화교류정책 평론가)
전)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연구교수
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전임연구원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