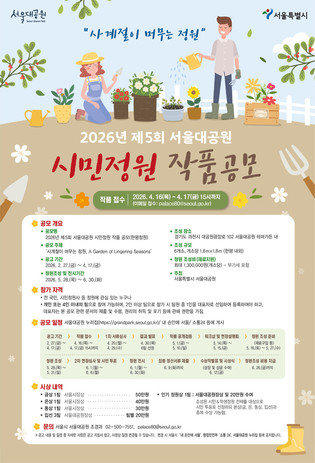|
| ▲ |
『五輪書』는 원래 그가 그의 추종자들과 직계 제자들을 위해 편찬한 것으로 이는 대략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 서간집이다. 그가 검 대결에서 이기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전수하기 위해서 집필했다. 이는 참선자의 지침서와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이 서적은 상대를 검으로 살생하는 방법에 대한 검술 교과서 역할 뿐만이 아니라 실천철학적인 사상을 담은 삶의 지침서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가 저술한 『五輪書』는 오늘날에도 전 세계의 무도수련자와 지도자들에게 연구되고 있는 대상이다.
다음으로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가 사용했던 검술이다.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의 검법 ‘二天一流’는 ‘二刀流’로써 이는 그가 만년에 저술한 『五輪書』에 집대성되어 있다. ‘二刀流’란 두개의 검을 가지고 사용하는 검법이다. 그의 검법은 사무라이(武士) 정신과 결합되어 봉건시대 도덕과 윤리의 바탕이 됐다. 일본 사무라이(武士)의 전통적인 대소쌍검은 허리에 찬 대도와 소도를 사용한다. 대도를 오른손에 소도를 왼손에 들고 대결하면 정 쌍검, 이와 반대로 검을 잡으면 역 쌍검이다.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는 이 형태가 아닌 대도 두개를 사용했는데 그의 자화상을 보면 그것은 대도와 소도의 조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자화상속의 검의 조합처럼 ‘二天一流가 대도와 소도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가 그의 저서 『五輪書』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실전 검 대결에서 이왕 죽을 바에는 허리에 차고 있는 검을 전부 사용해 보자는 그의 실용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범수학(2003), 『This is 최배달』, 찬우물 출판사).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금욕주의자이자 어떤 승부에서도 적을 반드시 제압하는 철저한 원칙을 가진 무도인이었다. 그는 실전 검술 대결에서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상대와 자기 자신 사이에 정신과 기술을 절묘하게 조화시켜야 된다고 보았다. 가마다(鎌田)는 ‘<萬理一空>’이라는 용어가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의 만년에 구마모토 ‘泰勝寺’ 승려들의 영향으로 좌선에 몰두한 결과의 산물이라 한다(鎌田茂雄(2000), 『五輪書』, 東京講談社).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가 <萬理一空>에 착목한 것은 성주 호소카와 다다토시(細川忠利)가 죽기 이전이며 이는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가 영암동에 칩거하여 좌선에 몰두하며 『五輪書』를 집필하기 훨씬 이전이었다. 호소카와 다다토시(細川忠利)가가 죽자 실의에 빠진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가 『五輪書』를 완성하기 3년 앞서 쓰여진 <兵法35箇條>(<병법35개조>는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가 구마모토 성주 호소까와에게 바친 각서 형식의 검법서를 말한다(이진수(2004), 「<萬理一空>에 관하여」, 한국도교문화학회)에 이미 ‘<萬理一空>’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가 호소카와 다다토시(細川忠利)가의 손님으로 구마모토에 부임한 것은 1640년이다. 부임한 즉시로 그는 호소카와 다다토시(細川忠利)의 요청으로 ‘二天一流’의 검법 진수를 이 <병법35개조>로 정리하여 호소카와 다다토시(細川忠利)가에게 제출한다.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가 ‘병법 二刀의 一流를 여러 해 단련한 시말을 여기에 처음 글로 하여 종이에 쓴다’고 밝혔으니 이는 1641년 2월의 일이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를 인정한 호소카와 다다토시(細川忠利)는 <병법35개조>를 완성한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3월 17일에 사망하고 만다. 호소카와 다다토시(細川忠利) 힘을 빌려 ‘二天一流’ 검법을 널리 세상에 홍포하려던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아마도 <萬理一空>이 ‘인생무상(人生無常)’과 연결된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 연유한 것일 가능성은 충분하다. <萬理一空>’(韓國道敎文化硏究 『<萬理一空>에 관해』, 와다나베는 그가 校註한 『五輪書』에서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가 태승사의 승려 오오부치나 하루야마등과 교유를 맺고 선수양에 몰두하여 인격이 원만해졌다고 한다. ‘渡辺一郞 校註, 五輪書, 岩波文庫’에서 가마다(鎌田)는 만년에 영암동에 들어가 참선에 몰두한 결과 <萬理一空>이란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의 선의 오도가 나타난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鎌田茂雄, 五輪書, 講談社學術文庫’에서 에자키(江崎)는 무사라는 것에 회의를 느낀 만년의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가 선승들과의 교류를 통해 인공, 법공의 경지를 깨달았다고 한다. ‘江崎俊平, 日本劍豪列傳, 學硏文庫’(이진수(2004), 「<萬理一空>에 관하여」, 한국도교문화학회)의 대목은 병법35개조에 이은 36개조로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萬理一空>에 관한 것, <萬理一空>이라 하는 것은 글로 표현하기 어려우니, 스스로 공부해야할 것이다. 이 대목이 36조로 명명되어 <병법35개조>에 등장하는 것은 이것이 35개조로 나누어 설명된 실제의 검법과는 구별되는 현학적(衒學的)이고도 독특한 대목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병법35개조>에 이 <萬理一空>의 조를 넣으면 이를 병법36개조라 해야 마땅하다. 이 <萬理一空>의 조목을 제하면 나머지 35개조는 검법의 실기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이진수(2004), 「<萬理一空>에 관하여」, 한국도교문화학회).
그렇다면 이 <萬理一空>의 각 조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또한 이 대목에서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가 ‘글로 표현하기 어려우니 스스로 공부해야 할 것이다’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란 말인가!
아마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병법35개조에 구전으로 한다고 표현한 대목은 이 <萬理一空>의 조목과 35개조목의 ‘때를 알것’ 이란 대목뿐이다. 때를 안다는 것은 빠름, 늦음. 벗어나야 할 때, 물러나면 안 될 때를 아는 것이다. 直刀라는 極意의 太刀가 있는데 이것은 입으로 전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이진수(2004), 「<萬理一空>에 관하여」, 한국도교문화학회))는 이 부분을 글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두고 호소카와 다다토시(細川忠利)에게 설명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병법35개조의 끝에서 ‘한 몸에 닦은 일류의 太刀法에 관한 口傳은 글로 쓰지 못했다. 부족한 점은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그가 검법을 가르치고 설명해 줄 상대인 호소까와는 이미 사망하고 없었다. 1643년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는 『五輪書』를 지수화풍공의 각 권에 정리한다. “이 두루마리를 공이라 한 것은 무엇인가 깊이가 있어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을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도리를 얻었으면 도리를 떠나, 병법의 道에서 자유롭고, 다른 사람에 비해 역량이 뛰어나며, 때가 되면 상대의 박자를 알고, 손에 검을 들었는지 검이 내 손에 있는지를 잃어버린 체 상대를 쳐서 맞히는 것이 空의 道이다. 내가 實의 道에 들어가는 것을 기록한 것이 공의 두루마리이다.”
地의 두루마리에서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는 『五輪書』의 마지막 두루마리를 공(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의 『五輪書』 空의 두루마리에 나타난 <萬理一空>’의 내용을 살펴보면(鎌田茂雄(2000), 『五輪書』, 東京講談社). “사물의 모습이 없어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것이 공이다. 공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사물이 ‘있음’을 알아야 비로소 ‘없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공이다. 속세의 비속한 견해는 사물의 도리를 판별하지 못하는 것을 공이라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공이 아니며 사람을 미혹시키는 마음이다.
병법의 道에서도 무사가 道를 행하는데 무사의 법을 모르는 것은 空이 아니다. 여러 가지로 망설여 결단하지 못하는 것을 空이라 하나 이것도 진정한 空은 아니다. 무사는 병법의 道를 분명하게 알고, 그 밖의 무예를 닦아 무사가 해야 할 일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며, 마음에 주저함이 없이 잠시라도 게을리하지 않으며, 心意의 마음을 갈고, 觀見의 두 눈을 떠, 헤매는 구름이 하나도 없어 조금의 흐림도 없이 갠 것, 이것이 진정한 공임을 알아야 한다. 진정한 도를 알지 못할 때에는 불법도 모르고 세상의 법칙도 몰라서 오로지 자기 자신의 道가 분명하다 생각하고 좋은 일이라 생각하지만, 마음의 바른 도리와 세상의 큰 법칙에 비추어 보면 각자의 마음이 편벽되고 눈이 흐려 진정한 道를 거슬렀음을 알게 된다.
그 마음을 알고 바른 것을 근본으로 삼아 진정한 道로 삼고, 병법을 행할 때에 바르고 밝은 곳, 큰 곳을 생각하며, 空을 道로 하고, 道를 空으로 보아라. 空은 악이 없고 선만 있다. 지혜, 리, 道가 있어 마음은 空이 된다.)이라 명한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이진수(2004), 「<萬理一空>에 관하여」, 한국도교문화학회).
그러면 병법의 道란 무엇이란 말인가!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가 『五輪書』에서 말한 병법은 중국의 孫子 혹은 吳子로 대표되는 일반적인 兵法처럼 전술이나 전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가 말하는 병법자는 ‘太刀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병법의 道는 그 자신의 고유한 무예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한다. 이번 칼럼에서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 『五輪書』 <萬理一空>>를 접한 최배달(崔倍達)의 깨우침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현시대의 무도교육에서 무도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전해주고자 했다. 이는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의 『五輪書』 <萬理一空>>를 접한 최배달의 깨우침은 극진 가라테의 정신적 배경으로 오늘날에도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송일훈 박사(동아시아 무예전쟁사·문화교류정책 평론가)
전)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연구교수
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전임연구원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