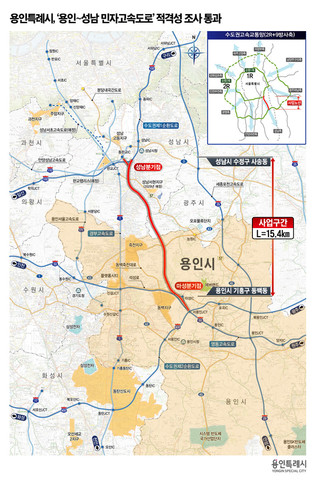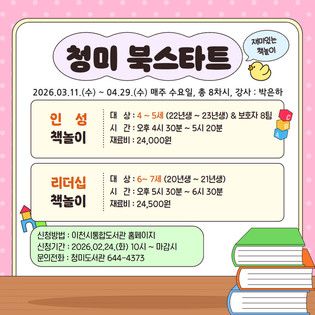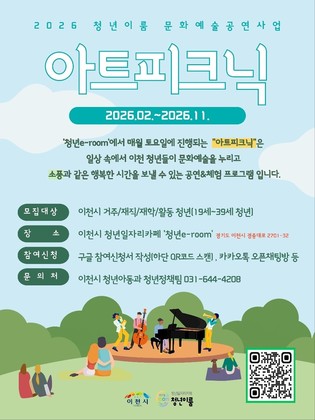|
| ▲ |
6월 균정의 매서(妹婿 : 妹弟) 아찬 예징과 아찬 양순이 망명하여, 우징에 휘하 투속했다. 이듬해 서기 838년 정월 상대등 김명은 왕을 핍박하여 이를 시해하고 스스로 왕에 즉위했으니 그를 민애왕(閔哀王)(?~839)이라 한다. 이듬해 2월 균정.우징의 도당이었던 김양(金陽)(808~857)은 병사를 모집하여 청해진에 들어가 우징(祐徵)을 알현했다(《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 10, 閔哀王 元年 二月).
우징은 청해진에 있으면서, 김양의 찬위를 듣고, 궁복에게 그 병력으로 김명을 토벌해 줄 것을 청하니 궁복이 이를 수락했다. 《三國遺事》에는 “이때에 궁복의 언행을 기술하여 이르기를 하였다”는 기록이다. 특히 “무주 철야현에서의 우징, 궁복군(弓福軍)의 승리를 기술하였다”는 기록인 보인다.
개성 2년(837년) 8월에 전 시중 우징이 잔병(殘兵)을 거두어 청해진으로 들어가 대사 궁복과 결탁하여 불구대천의 원수를 갚으려 했다. 김양이 소식을 듣고 모사(謀士)와 병졸을 모집하여 3년 2월에 해중(海中)으로 들어가 우징을 만나보고 함께 거사할 것을 모의했다. 3월에 강병(强兵) 5천인으로서 무주(武州)를 습격하여 성 아래에 이르니 고을 사람들이 모두 항복했다. 다시 나아가 남원(南原)에 이르러 신라군과 마주 싸워 이겼으나, 우징은 군사들이 피로한 것 같아 해진(海鎭)으로 돌아가 병마를 쉬게 했다. 12월에 다시 출동하매 김양순(金亮詢)이 무주 군사를 데리고 와서 합류했다.
우징은 또 날래고 용맹한 염장(閻長), 장변(張弁), 정년(鄭年), 낙금(駱金), 장건영(張建榮), 이순행(李順行) 등 여섯 장수를 시켜 병사를 통솔케 하니 군용이 매우 성했다. 북을 치며 행진하여 무주 철야현(鐵冶縣) 북쪽에 이르니 신라의 주대감(州大監) 김민주(金敏周)가 군사를 이끌고 맞받아 쳤다. 장군 낙금, 이순행이 기병 3천으로 저쪽 군중에 돌격해 들어가 거의 다 살상했다. 4년 정월 19일에 군사가 대구(大丘)에 이르니 왕이 군사로써 항거하므로, 이를 받아치자 왕의 군사가 패하여 달아나고 생포된 자와 목베인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이 때 왕이 허겁지겁 이궁(離宮)으로 도망해 들어가니 군사들이 마침내 그를 찾아내 살해했다(《三國史記》, 卷44, 列傳4, 金陽, 至開成二年八月).
특히 염장 이하는 장보고의 군사이며 정년은 여러 군사중의 한 사람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앞서 ‘군사 5천인을 내어 그의 동생인 정년에 주어 운운’이라 한 것은 《新唐書》 신라전 중에 ‘장보고 병사 5천인을 나누어 정년에게 주며 이르는 말이 정년의 손을 잡고 울분하면서 이르기를, 그대가 아니면 능히 화란을 평정할 수 없다고 운운’이라 한 부분을 골라서 삽입한 말로서 신라의 사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징의 군대는 이듬해 서기 839년 윤 정월 밤낮으로 서둘러 19일 달벌지구, 즉 지금의 대구에 이르러, 민애왕(閔哀王)(?~839)의 군사와 한번 싸워 크게 이긴다. 이 왕은 병사에게 시해되어 우징이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신무왕(神武王)(?~839)이다. 궁복은 감의군사(感義軍使)로 봉해지고 그에게 식읍 2천 호를 봉해주었다. 그가 군사에 봉해진 일은 신라에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강대한 번진이 공연히 나타난 것이라 사료된다.
그런데 이해 7월 23일 신무왕(神武王)이 사망하자 태자 경응(慶膺)이 즉위하였는데 그가 바로 문성왕(文聖王)(?~857)이다. 8월에 새 왕이 ‘궁복은 일찍이 병력으로서 신무왕을 도와 선조의 큰 역적을 멸하였으니 그 공렬을 어찌 잊을 수 있으랴’하고 이에 그를 배하여 진해장군을 삼고 겸하여 장복(章服 : 특별한 무늬나 기호를 붙인 의복)을 내리었다. 장보고가 패하여 사망한 것에 대하여는 《三國史記》 문성왕 7년 서기 845년 조에 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3월에 광이 청해진 대사 궁복의 딸을 취하여 차비로 삼으려하니, 조신들이 간하기를 부부의 도는 인간의 큰 윤리이다. 그러므로 하(夏)는 도산씨로 인하여 일어났고, 은(殷)은 신씨로 인하여 번창하였으며, 주(周)는 포사로 망하고, 진(晉)은 여희로 문란하였다. 나라의 존망이 이에 있으니, 그 어찌 삼갈 일이 아니랴! 지금 궁복은 해도의 사람이니 어찌 그 딸로 왕실의 배우자로 삼을까 보냐 하니, 왕이 그 말에 따랐다.
그 이듬해인 8년(서기 846)조에 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문성왕 8년(846) 봄에 청해진대사 궁복이 자기 딸을 왕비로 맞지 않는 것을 원망하여 청해진을 근거로 반란을 일으켰다. 조정에서는 근심에 싸여 어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때 용장(勇壯)의 사(士)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무주인(武州人) 염장이란 자가 와서 고하기를 조정에서 만일 자기의 말을 들어준다면 자기는 “일개 병졸도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궁복의 목을 베어 바치겠다”고 했다. 왕이 이를 허락하였다.
염장은 거짓으로 나라를 배반한 양하여 청해진에 투항하니 궁복은 장사를 사랑하는 터라 아무 의심 없이 그를 맞아 상객(上客)으로 삼고 함께 술을 먹으며 환락했다. 궁복이 취하자 염장은 그의 칼을 빼어 목을 벤 후에 그의 무리를 불러놓고 달래니 그들은 땅에 엎드려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11, 文聖王 8年, 八年 春).
위에서 언급한 《三國遺事》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인 보인다. 제45대 신무대왕이 잠저에 있을 때 협사 궁파(弓巴)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한 하늘 밑에서 살 수 없는 원수가 있는데, 네가 나를 위해 제거해주면 내가 대위(大位)를 차지한 후 네 딸에게 장가를 들어 비(妃)로 삼겠다”고 했다. 궁파가 수락하고는 협심 동력하여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침범해 그 일을 이루었다. 이미 왕위를 찬탈하고 궁파의 딸을 비로 삼으려 하니, 여러 신하들이 지극히 간하기를 “궁파는 비천한데, 상께서 그의 딸로 비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하니, 왕이 따랐다. 이때 궁파가 청해진에 있으면서 국경을 지키고 있었는데 왕이 약속을 어긴 것을 원망하여 반역을 꾀하고자 했다. 이때 장군 염장(閻長)이 그 말을 듣고는 아뢰기를 “궁파가 장차 불충을 저지르려고 하니 소신이 청컨대 제거하고자 합니다”하므로, 왕이 기꺼이 허락했다.
염장이 왕명을 받고 청해진으로 가 알자(謁者)를 통해 전달하기를 “저는 국왕에게 작은 원망이 있어 명공(明公)께 몸을 바쳐 신명을 지키고자 합니다”고 했다. 궁파가 그 말을 듣고는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너희 무리가 왕에게 간하여 내 딸을 비로 삼지 못하게 하였는데 어찌하여 나를 만나려 하느냐?” 하였다. 염장이 다시 전하기를 “이는 백관들이 간한 바이지 나는 그 모의에 관여하지 않았으니, 명공께서는 의심하지 마소서.” 하였다. 궁파가 그 말을 듣고는 청사(廳事)로 불러들여 “경은 무슨 일 때문에 이곳에 왔는가?”하니, 염장이 말하기를, “왕의 뜻에 거스른 바가 있어 막하(幕下)에 투항해 해를 모면하고자 합니다”고 했다.
궁파가 말하기를, “다행한 일이다”하고는 술자리를 마련하고 매우 기뻐하였는데, 염장이 궁파의 장검을 가져다가 죽였다. 그러자 휘하의 군사가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모두 땅에 엎드렸다. 염장이 그들을 이끌고 서울로 돌아와 복명하기를, “이미 궁파를 죽였습니다”하자 왕이 기뻐하여 상을 주고 아간(阿干)을 제수했다(《三國遺事》, 第2卷, 紀異 第2, 神武大王.閻長.弓巴條).
특히 《三國遺事》에서 장보의 딸을 비로 삼고자 한 것은 신무왕(神武王)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 사료된다. 신무왕은 개성 4년에 신라에 들어와 곧 바로 즉위하고, 그해 7월 23일에 사망했다. 왕비의 문제가 일어날 겨를이 없었으며 이는 왕과 함께 청해진에 투속한 문성왕(文聖王)의 황비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장보고를 베어 죽인 염장은 신무왕을 도와 신라에 들어간 장군의 한사람이다.
다음 칼럼 편에서 계속 연재한다.
송일훈 박사(동아시아 무예전쟁사·문화교류정책 평론가)
전)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연구교수
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전임연구원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